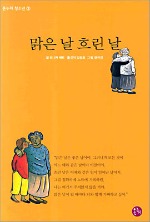|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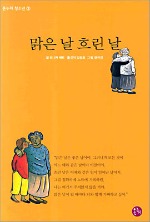 |
|
|
《맑은 날 흐린 날》
모니카 페트 지음
김정희 옮김
온누리 / 2005년
|
장마전선이 제주도 아래에서 슬쩍슬쩍 육지를 넘보고 있다고 해요. 이제나저제나 장마전선이 ‘북상’만 시작하면, 우리는 비 속 세상이 되어 물에 휩싸이겠지요. 어느 해 장마는 비 없이 잔뜩 흐린 날만 이어져, 농사에 큰 아픔도 있었어요. 일러 마른 장마예요.
어디나 그렇듯 책마을도 조금씩 장마준비를 해야 해요. 교실의 창 몇 군데는 비닐을 대 비를 막아야 한다, 무릎까지 자란 운동장의 풀은 장마 뒤로 미뤄 제초작업을 해야겠다, 식이에요.
이 장마가 끝나면 어김없는 불볕, 더위가 시작될 테지요. 가끔 만나는 난데없는 소나기 말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날들이 이어질 거예요.
맑은 날과 흐린 날,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에 만나는 감정도 그렇지요. 맑기도 하고, 때로 흐리기도 해요. 그래서 흐린 날은 앞으로 맑을 날을 기대하며 버티어내고, 맑은 날은 언젠가 흐렸던 날을 생각하며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지요.
지난 2005년 만들었던 책이 있어요. 그 책 제목이 ‘맑은 날 흐린 날’이에요. 청소년을 위한 책이었는데, 당시엔 조금 낯선 ‘치매’에 대해 이야기한 거예요.
주인공 에뷔는 할머니랑 사는 게 좋아요. 할머니랑 있으면 마음이 푸근해지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할머니에게는 깊은 병이 있었어요. 치매였어요. 증세가 나타나면 온 가족이 초 긴장상태가 되어요. 어디론가 사라지곤 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할머니는 아무런 기억을 하지 못해요. 할머니는 할머니대로, 에뷔는 에뷔대로 안타깝고 속상해요.
할머니와 에뷔는 작은 일기장을 마련합니다. 할머니에게 치매증세가 나타나는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을 모두 적어, 그 기록을 살펴보려는 것이에요. “난 여기서 주저앉지 않을 거야. 나는 그런 일이 얼마나 자주 일어나는지 알고 싶어. 그리고 맑은 날이 될 때마다 너와 함께 기뻐하고 싶어.”
두 사람은 할머니의 치매와 작은 ‘전쟁’을 선포합니다. 그러나 쉽게 끝날 싸움이 아니에요. 가족들은 결국 가족 모두의 정상적인 생활을 위해, 또 할머니 스스로를 위해, 양로원으로 모셔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물론 에뷔 생각은 크게 다르지요. 우여곡절 끝에 에뷔와 할머니는 ‘노인들의 주거공동체’ 생활을 선택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두 사람의 치매와의 싸움, 우리 모두가 응원해요.
평생 자식들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우리 사회의 ‘어른’들을, 더불어 가족 모두를 아프게 하는 것이 치매예요. 그 아픔에 눈 감지 말고, 주위를 둘러 살펴보세요. 우리 시선이 따뜻하면 할수록 그 아픔이 훨씬 누그러질 테니까요.
이대건(도서출판 나무늘보 대표)
|